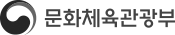문화예술공연

김시오 개인전 : 시간 사이
- 분야
- 전시
- 기간
- 2025.08.23.~2025.09.12.
- 시간
- -
- 장소
- 서울 | 갤러리 일호
- 요금
- 무료
- 문의
- 02-6014-6677
- 바로가기
- https://www.galleryilho.com/
전시소개
'초-일상(超日常)'의 정념
쏟아지는 햇살에 부서지는 강물, 뛰노는 아이들이 해질녘 그림자처럼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 새들이 푸닥거리는 모양, 커다란 등나무 아래로 떨어지는 빛 방울, 바닷물에 아스러지는 파도에 섞인 갈매기들의 울음. 평범한 모든 순간이 비범하고 찬란하다.
작품은 초현실적인 상상보다는, 익숙한 일상에 대한 감각적 이탈을 시도한다 작가가 포착하는 것은 비일상이 아니라, 지나치게 섬세하게 관찰된 '초-일상(超日常)'의 정념이다. 작품 속 장면은 환상이 아니다. 익숙한 것들이 너무 가까이에서 너무 오래 바라보일 때 드러나는 일종의 감각적 이탈이다.
작가는 어린이의 페르소나로 세계를 마주한다. 그는 빛의 조각들 사이를 유영하며,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로서 유니콘의 형상을 따른다. 김시오의 회화는 '비일상'이 아니라, 과하게 섬세하게 포착된 '초-일상'의 정념을 그린다. 그것은 세계를 새롭게 보게 하는 시선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풍경이 느닷없이 낯설게 다가오는 감정의 역류에 가깝다.
감각의 두께, '지금'의 밀도
현실의 시간은 흘러가지만, 감각은 그 순간을 붙들어 맨다. 메를로퐁티는(Maurice Merleau-Ponty) 지각이 단지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수동적 과정이 아니라, 신체를 매개로 세계와 엮이는 '살(flesh)의 교차점'이라고 보았다. 우리는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인 동시에, 세계의 일부로서 감각되는 존재다. 이러한 감각의 상호 얽힘은 어떤 장면이 단순히 '보이는 것'을 넘어서 체험되고, 기억되며, 재구성되는 하나의 '두께'를 형성하게 한다.
김시오의 회화는 바로 이 두께의 층위를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유니콘이 풀숲을 가로지르고, 아이들이 물속으로 뛰어들며 저녁노을이 수면을 스치는 장면들은 모두 일정한 현실의 궤도에서 살짝 이탈한 상태에 머문다. 그것은 과거의 회상이거나, 현재의 몽상이며,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의 감각적 실재다.
2023년 시리즈는 일상적 감각의 흐름을 느슨하게 엮으며, 빛과 움직임의 순환 속에서 감정의 결을 따라간다. 반면 2025년 시리즈에서는 동일한 형상들이 더 응축된 감각의 단층으로 등장한다. 화면의 리듬은 조용하지만, 붓질은 더욱 반복되고, 색채는 중첩을 통해 깊이를 만들어낸다. 감각은 더 이상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응고되고, 뭉쳐지고, 잔존하는 '밀도'로 작동한다. 이는 메를로퐁티가 말한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교차, 신체와 세계의 경계가 흐려지는 '감각의 장'과도 닮아 있다. 김시오의 회화는 바로 그 경계에서 일어나는 감각의 진동을 기록한다. 붓질과 색은 감각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며, 그 궤도는 지각의 시간 ― '지금'의 밀도로 이어진다.
감각으로 짜이는 세계, 회화로 엮이는 현실
김시오의 회화는 단순히 지나간 한순간을 추억하거나, 일상의 정서를 그림으로 번역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의 화면은 감각이 세계를 구성해 내는 과정, 다시 말해 '지각이 곧 세계를 짓는 행위'라는 메를로퐁티의 철학적 통찰을 실감 나게 드러낸다. 퐁티는 세계를 미리 정해진 객관적 구조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세계는 우리가 감각을 통해 얽히고 스며드는 과정에서 점차 생겨나는 것으로 본다.
이 관점에서 김시오의 회화는 마치 하나의 감각적 사건처럼 작동한다. 별빛이 깔린 수풀 사이를 유영하는 유니콘, 분수처럼 퍼지는 물의 입자들, 어린아이가 줄을 넘으며 손끝으로 밤하늘을 긋는 장면은 모두 현실의 장면이라기보다는 감각의 응축이 만들어낸 또 다른 현실이다.
회화 속 세계는 명확한 인과관계나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 대신 감각의 선명한 잔향, 지각된 세계의 주관적인 밀도가 하나의 회화적 공간을 만든다. 김시오는 마치 어린아이의 시선처럼, 대상과 배경, 사실과 환상을 구분 짓지 않은 채 세계를 직조한다. 이는 퐁티가 '세계는 하나의 얽힘(chiasm)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몸과 세계 지각과 표현이 서로 교차하는 감각적 직조의 장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김시오의 회화는 '본다'는 것이 단지 재현하거나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접촉하고, 그 세계를 감각의 질감으로 구성해 가는 하나의 창조적 행위임을 증명한다.
지금을 짓는 손
김시오의 회화는 순간의 감각을 포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감각이 지닌 존재론적 밀도를 우리 앞에 펼쳐놓는다. 그것은 특정한 사건도 아니고, 분명한 서사도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정서의 궤적이 있다. 화면 속 시간은 선형적으로 흐르지 않고, 어느 한 지점에서 감긴 채 빛의 결처럼 맴돈다. 관객은 그 안에서 특정한 '순간'을 본다기보다 감각의 밀도 속에서 머무는 일종의 '지금'을 체험하게 된다.
이 '지금'은 단지 현재라는 시간의 구간이 아니다. 메를로퐁티가 말했듯, 그것은 몸을 통해 세계와 교차하는 지각의 접점이며, 존재가 세계 안에 스며드는 감각의 결절이다. 김시오는 바로 그 접점을 화폭에 불러온다. 회화는 더 이상 현실을 재현하거나 내면을 표출하는 매체가 아니라, 지각이 살아 있는 상태 자체를 보여주는 장(field)으로 기능한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이제 회화의 효과가 된다. 빛이 닿아 흘러내리는 색, 그 위에 다시 쌓인 얇은 터치들, 구체적이지만 이름 없는 사물들. 김시오는 말한다.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의 그림 역시 그렇게 말한다. 이 순간, 이 이미지, 이 장면이 최초이자 마지막이라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아주
아주 기대
기대 보통
보통 분발해
분발해 실망
실망